Grand Prix winner's work at KWAFU thesis contest
논문현상공모 우수상 수상작
6·25전쟁납북인사 생사확인의 현실적 해결방안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4학년
노병춘
― 目 次 ―
第 1 章 序 論....................................................................1
第 1 節 問題의 提起..........................................................1
第 2 節 硏究 目的.............................................................1
第 3 節 硏究 範圍 및 方法.................................................2
第 2 章 大韓民國 拉北人士 發生問題....................................2
第 1 節 拉北人士의 定義....................................................2
第 2 節 拉北人士問題 發生原因...........................................3
第 3 節 拉北人士 送還努力.................................................3
第 3 章 拉北人士의 現況分析................................................5
第 1 節 韓國戰爭 당시의 拉北人士 現況과 分析....................5
1. 知識人 階層을 중심으로 拉北....................................6
2. 中年層을 重心으로 拉北..........................................7
3. 서울·경기地域에서 集中的으로 拉北........................8
第 2 節 『拉北人士 關聯消息 북측의 回答書』現況 分析........8
1. 拉北人士의 高齡化..................................................9
2. 拉北人士 89명(26.4%) 평양居住.............................10
第 3 節 資料分析整理.......................................................10
第 4 章 拉北人士問題에 관한 政府政策의 問題點................11
第 1 節 拉北人士問題에 관한 現政府의 政策變化過程..........11
第 2 節 拉北人士에 관한 政府政策의 問題點.......................12
1. 接近方式의 問題點....................................................12
2. 國民의 信賴와 共感帶 不足.........................................13
3. 政府의 消極性과 低姿勢.............................................13
4. 利害關係의 喪失.......................................................14
第 5 章 拉北人士의 生死確認의 現實的 解決方案..................14
第 1 節 基本 方向..............................................................14
1. 公論化를 통한 國內·外 基盤 造成...............................14
2. 誠意 있는 政府의 問題接近.........................................15
3. 多角的인 會談채널 活用을 통한 問題解決 追求..........15
① 國際機構를 통한 解決方案....................................16
② NGO들의 役割提高..............................................17
第 2 節 細部推進方案.........................................................18
1. 生死 및 所在地 確認.................................................18
2. 拉北人士 生死確認을 위한 法的·制度的 장치마련..........19
3. 拉北人士의 遺骸送還.................................................19
第 6 章 結 論....................................................................20
<參考文獻>...................................................................22
第 1 章 序 論
第 1 節 問題의 提起
분단, 그리고 전쟁... 반세기전 한반도를 피로 물들였던 한국전쟁은 우리 역사에 큰 상처를 남기고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우리 민족에게 안겨 다 주었다. 그 중에서도 납북인사문제는 분단이 우리에게 안겨준 가장 큰 고통 중의 하나이다. 납북인사문제는 분단이라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발생한 불행한 부산물 이였다. 특히 그 동안 한반도에서 분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납북인사문제가 더욱 금기 시 되는 사안으로 취급되어졌고, 납북인사의 가족들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가족의 납북 사실을 감추고 숨죽이며 어두운 시절을 보내야만 했다. 더욱이 납북인사가족에 대해 연좌제가 적용돼 관련 가족들은 납북인사의 생사문제와 송환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가족이 북으로 납치되었다는 비극적 사실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용공분자로 낙인찍히는 이중적 고통도 겪어야만 했던 것 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납북인사문제는 남북인사의 생명과 인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 뿐 아니라, 이제는 나머지 가족들의 물적·정신적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사회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받거나 사회로부터 소외를 받은 납북인사가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 되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납북인사 생사확인과 송환의 과정에서 반드시 선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납북인사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뒤따라야 한다고 하겠다.
第 2 節 硏究 目的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인사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분단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납북인사들이 이미 고령화 됐고, 시간이 감에 따라 하나 둘씩 세상을 등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납북인사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인사들은 대부분 30∼40대의 중년층들을 중심으로 납북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납북인사문제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가장 빨리 풀어야하고 해결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자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인 것이다. 납북인사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일은 어느 개인이나 단체, 정부 혼자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공동책임으로 함께 풀어 나갈 때 올바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납북인사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회담에서 문제안건에 대해 공통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듯이 북측의 호응 없는 납북인사문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 남북한 관계의 현실이다. 우리 정부도 그 동안 납북인사문제에 대해 성의 있게 북한의 태도를 추적하여 나름대로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 바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요인들을 의식하여 미리부터 납북인사문제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아예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납북자 문제 중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인사문제에 대해 발생원인을 비롯해서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인사 자료현황을 분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에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나타나는 정부정책의 문제점들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인사 발생원인과 현황을 분석해 본 다음 그 이후 납북인사문제에 관한 정부정책의 문제점들과 그에 따른 현실적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이 논문이 미약하나마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납북인사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활용되기를 바래본다.
第 3 節 硏究 範圍 및 方法
납북인사 문제의 경우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연구 성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북한체제의 폐쇄성으로 기인한 신빙성 있는 1차 자료의 빈곤을 들 수 있다. 즉, 현재 납북인사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의 공개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설령 있다고 해도 정전 이후의 납북 자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남북인사문제가 학문적으로 연구되기에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어려움과 제약사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객관성 있는 자료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학술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연구 논문과 각종 언론매체 및 간행물, 인터넷 등 신뢰성 있으면서도 시사성이 있는 자료들을 많이 수집, 분석하여 부족한 1차 자료를 최대한 보충하고 신뢰성과 현실성을 높여 납북자 문제의 현실적 해결방안들을 모색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납북인사문제가 현실적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과 매우 민감하게 직결되어 있고, 문제의 사안이 複雜多端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문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통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납북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연구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경애를 드리고 싶다.
第 2 章 大韓民國 拉北人士 發生問題
북한은 한국전쟁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민간인들을 강제 납북하였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은 주로 국회의원, 법조인, 고위관료, 종교지도자, 문인 및 예술인, 기술자, 교수 등 사회지도층의 주요 要人들을 중심으로 크게 두 차례에 걸쳐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납북하였는데 그러한 납북과정을 살펴보면 전쟁 발발이 체 한 달도 되지 않았던 1950년 7월에 이루어진 정계요인들과 종교지도자, 문화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납북(1차 납북)과 8월 중순경 주로 검찰, 경찰 등 소위 반동분자라고 지목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납북(2차 납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 할 점은 두 차례에 걸친 민간인 납치가 7월부터 신속하게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북한군이 인천상륙작전(1950년 9월 15일)으로 후퇴하면서 단순히 전쟁 중에 인질의 형태로써 납치를 자행한 것이 아님을 반증해 주기도 한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정전 이후의 납북은 항공기와 선박 승무원, 유학생, 어부, 교사 등이 주된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을 납북한 목적은 체제 선전 목적과 대남 혁명 전략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더욱이 지금까지도 이들은 북한에 억류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납북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자들이고, 나머지 유형은 정전 후의 납북자를 뜻한다. 본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납북자는 이 두 가지 유형의 납북자 중에서 전자에 해당하고, 주된 목적은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인사생사확인의 현실적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第 1 節 拉北人士의 定義
납북인사는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자에 대한 존칭어로써 큰 의미에서 납북자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 말이며 납북자는 분단 이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북한에서 사망했거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납북자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입북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이후에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북한에 억류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 할 수 있다.
반면에 월북자는 이념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북한으로 간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억류자의 경우는 앞의 두 정의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억류자의 경우, 먼저 간단히 정의를 내리자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억류된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억류자는 북한에 거주하게 된 동기를 불문하며 억류된 현재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즉, 억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될 때에는 경위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강조하는 용어로써 국군포로와 납북인사, 그리고 입국 시는 자발적이었으나 그 후 자의에 반하여 억류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사용되고 있다.
第 2 節 拉北人士問題 發生原因
1950년 6월25일 새벽 38선 전역에서 인민군이 일제히 기습공격을 개시했다. 전쟁이 터지자 마자 파죽지세로 남하하던 북한공산군은 전쟁 발발 이틀만에 서울 외곽인 의정부까지 당도해 있었다. 그런데도 이승만 정부는 당시 라디오를 통해 함락직전의 상황을 알리기는커녕 점심은 개성에서 그리고 저녁은 평양에서 먹을 수 있다고 국민들에게 거짓 선전을 하면서 서울을 떠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무책임한 거짓선전으로 인해 서울 함락이 임박한 시점에서 납북인사들은 적의 손길을 피해 피난 갈 준비를 하지 못했고 이윽고 공산군이 서울에 들어온 후에야 서울이 적군의 수중에 들어갔음을 알고 피난길에 나섰지만 한강 다리의 폭파(28일 새벽 2시30분경)로 결국 납북인사들은 피난길에 오를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수도 서울에서 납북된 인사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소앙(趙素昻) 선생과 소설가 이광수(李光洙), 손진태(孫秦泰) 서울문리대 학장, 현상윤(玄相允) 고려대 총장, 안재홍(安在鴻) 국회의원 등 各界의 指導級 인사와 엘리트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미처 서울을 빠져나가지 못한 시민들과 학생, 노동자·농민 등 수많은 인적자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북한 공산당에게 납북되었던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북으로 납북된 인원이 총 84,532명이나 된다. 여기서 주지하여야 하는 것은 납북인사문제 발생원인이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의 기본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함으로써 발생했으며 북한에 의해 강제로 끌러간 납북인사들에 대한 책임소재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
第 3 節 拉北人士 送還努力
〈표-1〉 拉北人士 送還관련 主要 經過
(출처: 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p.96∼101 ; 노중선 "연표"『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 운동 50년(1948∼1995)』, (서울: 사계절, 1996), p.26∼62
※* 拉南者 : 북한이 남한이 북한주민들을 데려왔다고 주장하면서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조 선말 큰사전에는 납치라는 말이 없다. 이로써 북한의 납남자 송환 요구의 허구성을 알 수 있다.
※* 失鄕私民 : 타의에 의해 고향에서 몰려난 사람을 뜻한다. 원인은 물론 천재지변 일수도 있고, 국제적 무력충돌이나 내란 또는 그 밖의 사회적·정치적 불안정 때 문일 수도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후자에 의한 경우이다. (출처: 두산세계대 백과 Encyber)
第 3 章 拉北人士의 現況分析
한국전쟁 당시 정부는 1953년 발간된『대한민국통계연감』에서 납북인사의 숫자는 84,532명이라고 통계를 발표한 적이 있고 1955년 9월 8일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적십자사에 1952년 캐나다에서 가결 채택된 가결상황 제 20조「이산가족의 재회문제」에 근거를 두어 납북인사와 미송환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대한적십자사가 제시한 납북인사의 숫자는 17,500명이었다.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6일 2개월간 대한적십자사는 북한군에 의해 강제 납북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납북자 안부탐지신고서」를 받아 조사한 결과 납북인사는 남자가 6,884명 이였고, 여자는 150명으로 총 7,034명 이였다. 이처럼 납북인사 자료정리 현황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날수 있다. 그 이유는 당시의 상황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이였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가 이루어 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의 체제와 이념의 갈등 속에서 남북은 납북인사 문제를 다룸에 있어,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전 후 지금까지도 남한과 북한이 관련 자료에 대해 침묵하고 그 문제에 대해 회피하는 것은 반도덕적이며 반인륜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양국 모두는 납북인사에 대한 관련자료를 철저히 조사해서 한국전쟁납북인사 가족들과 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정확하고 진실 된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마땅할 것이다.
第 1 節 韓國戰爭 당시의 拉北人士 現況과 分析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6일 2개월간 대한적십자사는 북한군에 의해 강제 납북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납북자 안부탐지신고서」를 받아 조사한 결과는 총 7,034명 이였다. 인민군 입대자와 자진 월북자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된 납북자 수를 나타낸 것이었다. 이렇게 조사된 대한적십자사의『失鄕私民登錄者名單』은 총 542쪽의 분량으로 姓氏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개개의 명단이 발송번호·성명·성별·연령·본적·납치장소·직업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失鄕私民登錄者名單』은 당시의 관련자료가 훼손과 망실 등으로 절대 부족한 점을 감안할 때 그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1. 知識人 階層을 중심으로 拉北
아래〈표-2〉를 보면 오른쪽 반(50%)이 넘는 납북인사가 공무원이나, 학자, 법조인, 전문직종사자(교사·의사·회사원·은행원), 기술자, 통역등의 비교적 知識人 階層 이였다는 것은 북한측이 단순히 납치한 것이 아니라 선별적인 작업을 거쳐 체계적으로 납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일 것이다. 주로 지식계층인 납북인사들은 당시 혼란한 전쟁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 북한의 전후 복구 사업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신고된 납북인사는 총 7,034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직종사자(교사·의사·회사원·은행원)가 1385명(19.7%)이 가장 많았고, 단일직업별로는 공무원이 1,359명(19.3%)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농민이 1,005명(14.3%)이고 상업인이 996명(14.2%)으로 나타났다.
〈표-2〉韓國戰爭 黨是 拉北人士 職業別 分布
(출처: 대한적십자사, 『실향사민등록자명단』, 1956년, 참조)
2. 中年層을 重心으로 拉北
아래 〈표-3〉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30∼40대의 중년층이 4,253명(60.5%)으로 눈에 띄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인사들은 중년층의 사회인이 많았음을 나타내 준다. 그리고 여기서 10∼20대의 청년들도 1,336명(19%)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그들의 나이를 고려해 볼 때 생존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도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최고령 자는 89세(3명)이고 최연소 자는 18세(1명)이였다.
〈표-3〉韓國戰爭 黨是 拉北人士의 年齡別 分布
(출처: 대한적십자사, 『실향사민등록자명단』, 1956년, 참조)
3. 서울·경기地域에서 集中的으로 拉北
아래 〈표-4〉 납북지별 분포를 살펴보면 납북인사가 경기 이북(서울, 경기, 강원도)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총 7,034명 중 6,575명(93%)이 서울 이북지역에서 납북되었다. 그러한 이유는 한국전쟁 납북인사 가족의 증언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강대교까지 피난을 갔었는데, 군인들과 경찰들이 "서울은 사수될 것이니 집으로 돌아가라"로 하면서 길을 막고 못 가게 하였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군 장비와 군인들만 남하시키고 다리를 폭파시켰는데, 한강 다리의 폭파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이북지역 주민들의 피난길이 막히면서 대량의 납북인사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표-4〉韓國戰爭 拉北人士의 拉北地別 分布
(출처: 대한적십자사, 『실향사민등록자명단』, 1956년, 참조)
第 2 節 『拉北人士 關聯消息 북측의 回答書』現況 分析
대한 적십자사는 신청을 받은「납북자 안부탐지신고서」를 1956년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북한조선적십자사에 명단을 넘겼는데, 1957년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로부터 이 중 337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음을 확인됐다. 북한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로부터 회신된 생존자 명단은『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s)소식조사 회답서』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회답서양 식 에는 발송번호·연도·성명·생년월일·성별·최종직업·본적지·최종거주지·依賴者성명·그(납북인사)와의 관계·소식조사결과 등으로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1. 拉北人士의 高齡化
아래〈표-5〉소재확인자 출생 년도별 분포를 보면, 1921∼1930년까지 출생자가 187명으로 55.5%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다음으로 1931이후(1935년까지)의 출생자가 68명으로 20.2%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소재 확인 납북인사들이 70세가 넘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가능성도 계속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납북인사의 고령화(소재 생존자 중 약 80%)는 납북인사의 문제의 시급함을 반증해 주고 있다.
〈표-5〉所在확인자 出生年度別 分布
(출처: 조선적십자,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 1957년, 참조)
2. 拉北人士 89명(26.4%) 평양居住
〈표-6〉에서 납북인사들 중에서 소재가 확인된 사람은 337명이다. 이 중에서 납북인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던 곳은 평양으로 89명(26.4%)이 소재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평안남도 55명(16.3%), 황해북도 46명(13.6%)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6〉所在확인자 分布
(출처: 조선적십자,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 1957년, 참조)
第 3 節 資料分析整理
『실향사민등록자명단』과 『실향사민 소식조사 회답서』는 한국전쟁 당시 실종자 유형구분에 큰 도움이 되는 역사적 자료이다. 또한 최근에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1950년 한국전쟁 당시의 정부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서울시 피해자 명부』를 고서수집가로부터 입수해 공개했다. 이 명부에는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쟁피해자 4,616명의 명단이 9개 구별로 분류돼 수록돼 있었다. 이 명단이 밝혀짐에 따라 『실향사민등록자명단』총7,034도 사실일 가능성 또한 한층 커지게 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그 동안 전쟁 중 혼란기라 납북인지 월북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에서 한국전쟁 납북인사들을 납북자 분류에서 제외시켜 왔다. 그러한 무관심한 정책으로 앞으로 열릴 예정인 제4차 이산가족상봉에서도 한국전쟁 납북인사들은 상봉대상자에 포함되지 못 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측이 생사확인을 할 수 없다고 통보 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국전쟁 납북인사가족들은 왜곡됐던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다. 위의 자료들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앞으로도 납북인사가족들의 납북인사 생사확인 및 송환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번 자료는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 국한된 자료가 아니라 전국적이고 전 계층이 망라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 후 당시 납북인사의 총체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前提 資料」라고 본다.
이제는 6.·25납북인사가족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기다. 따라서 새로 발견된「前提 資料」를 바탕으로 납북인사에 대한 정보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북한측과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전담반」이나「상설기구」를 설치해서 충분한 인력과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할 것이다. 이는 꼭 납북인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와 연계해도 무방할 것이다. 단 납북인사문제를 이산가족문제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또한 1956년의 『납북자 안부탐지 신고서』는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당시 신고한 당사자 다수가 사망하거나 이사를 갔기 때문에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번에 납북인사에 대한 「再 신고접수」를 실시하여 생존여부 확인·송환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第 4 章 拉北人士問題에 관한 政府政策의 問題點
남북은 역사적인「6.15남북공동선언」이후 남북간의 이산가족상봉단 교환방문이 이루어졌고 서신교환 및 면회소 설치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납북인사문제를 넓은 의미에서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해결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납북인사문제의 해결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납북인사문제의 성격은 일반 이산가족의 문제와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이산가족은 이산동기에 자발성이 있으며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문제를 논할 대상이 아니지만 납북인사는 이산동기에 북한의 고의적인 강제성이 존재하고, 정부는 이렇게 납치된 국민에 대한 책임을 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납북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정책의 문제점에 반드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第 1 節 拉北人士問題에 관한 現政府의 政策變化過程
정부는 납북인사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여론을 환기하기 위하여 홍순영 전 외교통상부장관이 1999년 3월 25일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on)
총회에서 행한 특별연설에서 납북인사들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의 송환을 촉구했었다. 홍순영 전 장관은 특별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간첩행위로 복역 중 지난 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북한사람들을 돌려보낼 용의가 있는바,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당국도 자신의 뜻에 반하여 북한에 억류중인 상당수 납북자들과 여타 인사들을 남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정부는 납북인사에 대해서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상호주의(Reciprocity)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1999년 4월부터 이루어진 남북 차관급 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의 의미를 "해방이후부터 6·25이후 헤어진 가족을 포함하여 6·25이후 自進해서 월북한 사람들까지 신형 이산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범위를 대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이는 과거의 정권들보다 전향적인 정책으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 시대로 나가기 위한 대북 포용정책(Engagement)에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는데, 이러한 포용정책의 성과에 힘입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고 남과 북의 정상들은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5개항에 합의했으며 합의사항 중 제3항인 "이산가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는 63명의 非 轉向 장기수를 인도적 차원에서 송환한다고 발표한다. 이때부터 정부는 납북인사와 국군포로 문제를 넓은(廣意)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해결해 나간다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정부정책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납북인사문제에 대해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지 못 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신축적인 상호주의」라고 했다. 하지만 「신축적 상호주의」에도 회담에서 정책 우선 순위가 있다. 정부는 납북인사문제를 정책의 우선 순위로 정하여 회담에 임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非 轉向 장기수문제를 20년 넘게 남북관계의 우선 순위 정책으로 삼아 오면서 회담에서 끈질기게 요구해 결국 관철시키고 말았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 해 주는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신축적 상호주의」가 아니라 자국민의 보호를 우선하고 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신뢰받는 정부일 것이다.
第 2 節 拉北人士에 관한 政府政策의 問題點
1. 接近方式의 問題點
정부의 납북인사 문제의 접근방식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는 역시 같은 문제 즉, 납북 일본인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우선 북·일 수교 협상에서 납북 일본인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일본은 납북자의 문제를 납북되었다는 사실적 경위에 입각하여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우리 정부의 입장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납북인사를 이산가족이라는 범주에 넣고 상봉의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도 그럴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오히려 납북인사와 억류자는 없다라는 북한의 공식입장을 확인 시켜주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한다는 것은 납북인사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非 轉向 장기수가 그러하듯 납북인사들은 궁극적으로 상봉의 대상이 아닌 송환의 대상임에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해 간다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시범적 케이스로 납북인사 가족 몇몇만을 상봉시키고 결국 나머지 가족은 생사확인 및 상봉조차 가능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결국 정부의 접근방식의 잘못이 생사확인 및 상봉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장 주요한 원인 인 것이다.
2. 國民의 信賴와 共感帶 不足
現政府의 대북 정책은 한때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적이 있었다. 물론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었기에 가능한일 이였다. 하지만 대북 정책에 대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국민들의 응답은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도와 비교해 보면 국민들의 지지도와 인식이 매우 나빠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에 놓여서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북인사문제와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가 언론에게 관심을 받으며 이슈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납북인사문제나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여론은 불만이 아니라 분노에 가깝다. 이는 햇볕정책을 위한 북한 달래기가 국민의 생명보다 중시되는 정부 정책에 대한 것이다. 국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계속 납북인사 문제를 이산가족 차원의 문제로 해결하려 한다면 대북 정책에 관련한 국론은 더욱 분열되고 양극화 될 것이다. 또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쟁 격화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의 대북정책 및 납북인사 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야간 합의와 협의를 통해 정쟁을 감소시켜나가야 한다. 실제로 과거 서독의 역대 정부들의 경우에서 보더라도 서독정부는 對동독 정책에서 불필요한 정쟁을 가급적 배제하고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들과 야당으로부터 공개적인 혹은 묵시적인 지지를 받았었던 사례가 있다. 정부는 이점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이에 국회와 관련 부서, 해당기관들의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3. 政府의 消極性과 低姿勢
정부의 납북인사 문제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의 진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이는 남측은 이산가족 교환 방문사업을 통해 이뤄진 다섯 명의 가족 상봉을 애써 감추려한 반면 북측은 이들의 상봉을 적극적으로 공개했다. 2차 상봉 당시 남측은 김 할머니와 이형석 씨의 가족 상봉 소식을 일절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이들이 평양 방문단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북측이 상봉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북측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할머니의 아들 상봉 소식을 자신 있게 보도했고 남측 언론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뒤따라 부랴부랴 보도해야 했다. 이는 3차 상봉 때 국군포로 2명의 가족 상봉 사실을 먼저 공개한 것이 북측이었고 남측 언론이 이를 뒤따라 보도하면서 2차 때 공개되지 않았던 이형석씨 형제 상봉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는 사실에서도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또 남측이 공개한 납북자들의 가족상봉 장면은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한 것이 아니며 정치적 고려에 따라 대화 중 일부를 생략한 채 전한데 불과하다는 사실도 위의 추론을 뒷받침한다. 이런 전후 사정으로 미뤄볼 때 납북자 이산가족의 상봉공개를 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쪽은 북측이 아니라 오히려 남측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납북인사 생사확인 문제에서도 감지되는 남측의 소극성과 저자세의 문제는 더 이상 북측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정책의 消極性과 低姿勢가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궁색한 辨明이나 자꾸 번복되는 聲明보다는 積極性과 高姿勢로 납북인사 생사확인과 송환을 당당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利害關係의 喪失
우리 정부가 납북인사를 자발적으로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키겠다고 천명한 것은 북한과의 협상 입지를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 밖에 초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북한의 善意나 信義 또는 民族愛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利害관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된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이익에 근거하여 합의를 지키고 파괴적인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쪽이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합의를 볼 때 그 합의를 이행토록 하기 위한 이해관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양보나 퍼주기 식의 정책은 국민들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접근방식의 문제점, 국민의 신뢰와 공감대 부족, 정부의 소극성과 저자세, 이해관계의 상실, 이러한 네가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 볼 때 납북인사문제를 이산가족의 범주에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第 5 章 拉北人士의 生死確認의 現實的 解決方案
第 1 節 基本 方向
1. 公論化를 통한 國內·外 基盤 造成
납북인사 생사확인을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납북인사문제의 공론화를 통한 기반 조성이다. 국내적으로는 뜻 있는 국회의원들이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정부의 정확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지방 자치단체장들도 각 도마다의 납북인사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고 지방의 여론을 환기시키며 납북인사 송환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가 일시적인 관심으로 그치는 타성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방자치 단체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외적으로도 국제사회에 납북인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주의와 관심을 불러 일으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이 문제를 북한에게 남북한의 차원으로만 국한시킬 사안이 아니라 탈 국가적 차원인 인간의 기본적 인권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납북인사 가족들은 행동을 조직화, 체계화하며 지속적인 운동을 벌여 나가기 위한 기금 마련에도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임해야 한다. 결국 정부, 국민, 언론, 민간단체 사이의 공론의 장이 다양하게 형성되어야 납북인사 문제의 기반이 조성 될 수 있을 것이다.
2. 誠意 있는 政府의 問題接近
국제적·국내적으로 관심이 제고되면 정부가 납북인사 생사확인에 성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밝혀진 증빙자료만 제대로 분석해서 활용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를 통해 충분히 검증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화해·협력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할지라도 납북인사 생사확인과 송환문제에 대해 소신 있게 우리 입장을 피력해야 한다.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납북인사 문제를 제기하여 인권문제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납북인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스스로 입북한 월북자와 의거 입북자만 인정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가조치와 같은 업그레이드(upgrade)를 강구하면서 사회전반에 걸친 납북인사 생사확인에 대한 관심의 분위기 속에서 이젠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때다. 납북인사 생사확인은 더 이상 덮어두어서는 안될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노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납북인사들은 북한의 계급적 차별 속에서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납북인사 송환의 당위적 상황 속에서 정부는 한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 차원에서라도 생사확인과 송환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3. 多角的인 會談채널 活用을 통한 問題解決 追求
납북인사는 생사확인 문제에서 남북한간의 보는 시각이 판이하고 법리적인 해석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多角的인 會談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욱이 납북인사 생사확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남북한 당국간 회담을 제의하여 북한과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막후 교섭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결국 납북인사 생사확인 문제는 남북한 당사국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의 직접적인 대화에서 이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것은 껄끄러운 사안임에는 틀림없다고 해도 논의 자체를 회피하거나 어려움을 수반한다해서 미뤄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없다. 따라서「당국자회담」,「남북적십자회담」등 다각적인 남북접촉 경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납북인사 생사확인 문제해결은 남북한간의 정치적 신뢰와 평화구축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한이 성사된다면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의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추구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할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기본 방향도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납북인사 생사확인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① 國際機構를 통한 解決方案
테러리즘은 유엔 헌장과「국가들 사이에 우호관계와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들의 선언」(1970년 유엔총회 채택)에도 위반되는 범죄로 9.11 테러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테러국가나 지원하는 테러단체는 국제적인 제약과 제재로 고립에 처할 수밖에 없으며 전세계의 비난을 받게 된다. 한국 전쟁 당시에 자행한 납북인사문제는 테러리즘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또한 북한은 1987년 김현희를 비롯해 북측 공작원들에 의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됐으며 현재에도 테러지원 국으로 미국과 서방 선진국의 무역 및 경제제재를 받아왔다. 하지만 북한은 전세계의 반 테러 움직임이 확산되는 세계적 조류 속에서 작년 11월 3일「테러자금조달억제에 대한 관한 국제협약」과「인질억류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등 2개의 주요 반 테러 국제협약에 가입방침을 정했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북·미 관계의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이 이러한 가입결정을 한 것은 미국과 유엔의 국제적 반 테러 연대 움직임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은 텔레반 정권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소위 불량국가(rogue state)로 국제적으로 낙인찍혀 국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혹시 미국의 다음 테러국가 공격에 북한이 지목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감지하고 가입을 천명했는지도 모른다. 여하튼 이러한 북한의 선택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납북인사 문제를 해결을 시도할 경우 상당한 실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세계는 전지구적 문명권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9.11 테러와 같은 과도기적인 문제, 즉 종교·인종갈등, 지구환경문제, 인권의 문제, 기아와 빈곤 등의 문제점들을 노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공동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유엔이나 국제기구, 유럽연합(EU)과 같은 초국가적인 연합체가 전지구적인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며 그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최근 들어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며 국제적 연대를 통한 보호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은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나, 미 국무부의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등이 발간하는 각종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은 빠지지 않는 대표적인 인권유린국이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부각시켜 국제사회가 납북인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유엔총회나 유엔인권위원회(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sson: UNHRC)등 국제기구에서 납북인사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차원의 확인 및 요구작업은 필요하겠지만 유엔의 협조를 받거나 국제 적십자위원회(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ICRC)산하의『중앙심인사업소(中央審人事業所: Central Tracing Agency)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과 북한이 유엔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을 통해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생사확인 작업을 선행해 나가야 한다. 이들 국제기구는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위반국에 대해서는 국제적 제재와 원조결정의 객관적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에게 이 결정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북한이 국제사회나 국제기구에게 보여주기 식이지만 납북인사들의 생존을 유지하고 북한정부가 신경을 쓴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내 납북인사가족단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유엔인권위원회(UNCHR)와 인권소위원회, 유엔인권 고등판무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제네바 소재 유엔 인권센터에 편지 보내기 운동, 청원서 제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인권대사를 통해 납북인사들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들을 국제기구들에게 알리고 세계인권위원회의 협력과 지원 약속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② NGO들의 役割提高
오늘날의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각국의 정부기관(Governmental Organization)들 이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들 민간단체(NGO)들은 단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지 주요 현안문제들의 논의에 있어서 정부(GO)대표들과 동일한 자격, 권한을 가지고 참여하며, 유엔인권위원회(UNCHR)의 의제 채택과 토론과정, 결의 채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민간단체들의 운동을 활용하면서 인도적인 차원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국내 인권문제 관련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납북인사에 대해 청원을 하고 이들의 사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2001년도 한해 동안 대북 지원은 18차에 걸쳐 비료 20만 톤과 각종 구호 물자등을 합해 932억 3,283만원이고 그 중에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은 190억 6,641만원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상당한 부분의 대북 지원을 민간단체(NGO)들이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민간단체(NGO)의 많은 대북 지원금을 바탕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북한과의 협상카드로 사용한다면 납북인사 문제에 관해 현재의 성과는 그리 크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민간단체(NGO)들의 교류·협력 활동에 앞서 민간단체(NGO)들의 役割提高가 충족되어야 할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그 동안 납북인사 문제가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歪曲되어 온 현실을 감안해 볼 때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같은 민간단체(NGO)가「자료 찾기 운동」과「논문 현상 공모」등의 役割提高 활동들은 펼친다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50년 지난 이 시점에 와서야 바로 세운다는 데서 의의를 가지며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들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役割提高 활동은 민간단체(NGO)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노력은 더욱 부각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민간단체(NGO)들이 납북인사 문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을 인식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과거 정부로 비롯된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같은 민간단체(NGO)들이 相互補完하고 협력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第 2 節 細部推進方案
1. 生死 및 所在地 確認
납북인사 생사확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생사확인과 소재지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생사·소재 확인은 납북인사 및 그 가족들의 인적교류를 수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한측의 호응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납북인사의 생사확인과 소재파악을 위해서는 납북적십자사의 주관과 책임 하에「尋人依賴書」와「回報書」를 교환하는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간에 자유로운 인적 왕래가 실현될 경우 당사자가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여 직접 북한의 관계기관에 신청하여 확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現단계에서는 그러한 방식의 생사 및 주소 확인작업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납북인사 생사·소재 확인의 경우에는 좀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북한이 납북인사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고 납북인사들이 자진 월북자라고 강변하고 있는 바, 처음부터 납북인사의 생사·소재지 확인을 관철하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납북인사의 80%가 70세를 넘어선 지금 납북인사의 생사·소재 확인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그렇기에 현실적 방안으로 중국 및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을 고려 해볼 수 있는데 그러한 구체적 방한으로는 생사·소재 확인을 추진할 경우, 제 1단계로는 납북인사와 그 가족들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摘示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제 2단계로는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제한하는 조건에서의 생사·소재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단계로 연령제한을 철폐하는 조건에서 생사·소재 확인이다. 여기서 납북인사 생사·소재확인을 하거나 귀환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십자사(ICRC)가 남북한의 적십자사와 함께 공동조사 또는 의사교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조력을 제공 받아야한다. 이와 관련, ICRC산하의 기관인 중앙심인사업소(中央審人事業所: Central Tracing Agency: CTA)가 중국과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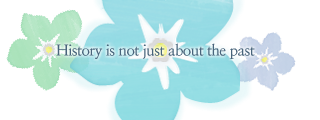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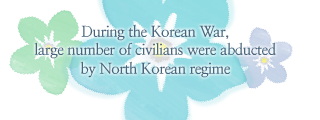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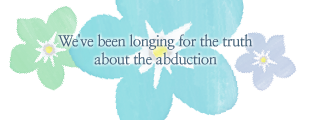









 FAX : (82)31-930-6099
FAX : (82)31-930-6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