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 open to everybody, free to use..
자료입니댜 퍼가실분은 퍼가세요
죄송합니다 처음 실렸던 것은 총분량 4페이지 중 1페이지만이었습니다.
이제 전문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잘 보아 주세요.
>> 2002년 06월 >> 심층취재 특종
[특종] 6·25 납북자 명단에서 찾아낸 200여 언론인 공개 (1/4)
--------------------------------------------------------------------------------
사장, 편집국장, 부장, 기자, 방송인들의 납북 경위와 인적 사항
세계 어디서도 없었던 언론인의 受難
●4명의 사장, 5개紙의 편집국장도 납북되다
●동아일보가 17명으로 가장 많다
●日章旗 말소 사건 일으킨 기자도
●북한군 서울 진입 직전 마지막 호외 뿌리고 납북되기도
●납북 언론인의 연령은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조사시점(1950, 1952, 1954, 1956)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1950년 납북 당시의 나이를 기준하여 하였다
●납북된 언론인이 북한에서 겪은 참상은 대한적십자사 발행 「이산가족백서」(1976)를 참고하였다
鄭晉錫 한국외국어대 교수(언론학)
--------------------------------------------------------------------------------
200여 명의 납북 언론인
주요내용
200여 명의 납북 언론인
납북 길에 탈출한 李東旭
필자의 말-돌아오지 못한 언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납북언론인 명단
1950년 6월25일 金日成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에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최소 8만여 명이 넘는다. 정부는 서울이 중공군에게 함락되기 전의 긴급한 상황이었던 1950년 12월 서울에서 납북된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그 후 세 차례에 걸쳐 전국에 걸친 피해상황을 조사하였다. 대한적십자사도 1956년에 납북자들에 대한 등록을 접수하여 송환을 위한 교섭자료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전쟁 납북자 관련 자료는 모두 다섯 종류가 있다. 정부와 적십자사가 조사한 이들 자료를 보면 북한군이 서울에 진주한 직후부터 얼마나 많은 인적자원을 조직적으로 北으로 끌고 갔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 다섯 종류의 자료를 조사해 보면 일간신문, 통신사, 방송사에 종사하다가 전쟁 중에 피살 또는 납북당한 언론인은 206명에 달한다. 출판사에 종사했던 사람까지 포함하면 226명으로 늘어난다. 소속사를 밝히지 않고 직업이 「언론인」 또는 「기자」로 기재된 사람을 제외하고 소속사가 확실한 언론인으로 범위를 제한해도 128명이나 된다. 이처럼 많은 언론인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납치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을 것이다.
납북된 언론인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들의 生死에 관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부차원에서 밝힐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언론계에서도 늦었지만 그래도 납북 언론인의 자료를 언론관련 국제기구에 제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업을 벌여야 할 것이다.
납북되기 前에 이미 처형당한 언론인도 있었고, 납북된 후에 처형되거나 열악한 환경과 기아, 질병 또는 강행군을 견디지 못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도 있다. 대부분은 생사를 알 수 없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또는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6·25 전쟁의 와중 또는 그 직후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에서 납북자들의 피해상황을 조사했지만, 그 후로는 이들에 대한 관심도 점차 퇴색하여 반세기가 흐른 지금은 그런 자료가 있는지조차 잊어버린 상태가 되었다.
다행히 2000년 12월에 「6·25戰爭拉北人士家族協議會」(이사장 李美一)가 결성되어 자료의 발굴작업이 시작되어 납북자 명단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납북자 가운데는 많은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언론인에 관해서는 종합적인 명단조차 파악된 적이 없었다. 다만 1994년 8월 전직 언론인들의 모임인 대한언론인회가 적십자사의 자료 가운데 언론인 60명이 있음을 밝혀낸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 언론인으로 종사한 적이 있거나 언론사의 이사 등 경영에 참여한 사람과 방송인, 출판인도 넓은 의미의 「언론인」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포함한다면 납북 언론인의 숫자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정부와 적십자사가 작성한 다섯 종류의 자료를 모두 조사하여 납북된 언론인의 총체적인 규모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납북자의 실태를 조사한 다섯 종류의 자료에 관해서 잠시 살펴본 다음에 어떤 언론인들이 납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공보처, 1950.12) 조사대상은 14세 이상, 서울市 거주자 가운데 인민군에 「의용군」으로 출두한 사람은 제외하고 강제 납북자만 수록한 명단이다. 9개 구청별로 조사한 이 자료는 성명,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북(피해)된 날짜, 피해 종류(납치, 피살, 행방불명), 납북된 장소, 약력, 주소 등을 적고 있다.
2) 「6·25 사변 피납치자 명부」(대한민국정부, 1952.10) 서울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납북자 명단을 작성한 것이다. 이 자료도 위의 「피해자 명부」와 거의 같은 양식이지만 피살자나 행방불명자를 제외한 「납북자」만을 대상으로 한 점이 다르다. 이 명부에 수록된 전국의 납북자는 8만661명이다.
3) 「피납치자 명부」(내무부 치안국 정보과, 1954) 이 자료도 서울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납북자 명단을 작성한 것이다. 이 자료의 특징은 「피랍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점이다. 인민군, 내무서원, 정치보위부원 등 누구에 의해 납치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4) 「실향사민 등록자 명부」(대한적십자사, 1956) 1956년 정부가 국제적십자사를 통해 납북 인사의 송환을 요구했던 「실향사민 교환」 교섭을 위한 자료로 작성한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를 위해 1956년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2개월 동안 납북인사들의 등록을 접수하였는데, 등록된 피랍 인사들을 직업별로 분류한 결과 「언론인」은 75명이었다. 그러나 납북 당시의 현직이 언론인이 아니었더라도 과거의 경력으로 보아 언론인에 포함시켜야 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향사민 등록자 명부에 들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언론 경력을 가진 사람들과 방송인, 출판인을 포함하면 언론인의 숫자는 90여 명이 넘는다.
5) 「6·25 사변 피살자 명부」(공보처 통계국, 1952.3) 성명, 성별, 연령, 직업, 피해 연월일, 피해 장소, 본적, 주소 등 총 8개 항목으로 피살자들의 신원을 기록한 자료이다. 凡例(범례)에 「6·25 사변 중 공무원 및 일반인이 잔인무도한 괴뢰도당에 피살당한 상황을 조사 편찬하였다」면서, 대상을 「軍警을 제외한 非전투자에 한하였다」고 밝혀, 인민군 등 좌익에 의해 피살된 민간인들의 명단만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의 피살자는 5만9964명으로 남자가 4만4008명, 여자가 1만5956명이다.
위의 다섯 종류 자료 가운데, 치안국 정보과가 조사한 「피납치자 명부」는 프린트 인쇄가 조악하여 글자가 보이지 않거나 판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로 활용하기에 애로가 있다. 그러므로 치안국의 자료를 참고로 하고 나머지 네 개 자료를 토대로 납북 언론인을 찾아내어 중복되는 인물을 종합해 본 결과 200명이 넘는 「언론인」들의 구체적인 숫자와 이름을 밝힐 수 있었다.
북한의 남침과 언론인 납북
북한은 1949년 초부터 전시체제에 돌입하여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1950년 6월25일 새벽 4시경 서해안의 옹진반도에서 동해안까지 38선 전역에 걸쳐 국군의 방어진지에 맹렬한 포화를 집중시키면서 기습공격을 개시하여 3년 간에 걸친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탱크를 앞세우고 파죽지세로 남하하기 시작한 공산군은 38선 돌파 후 불과 이틀 만에 수도 서울에 침입하였고, 미처 피난하지 못한 채 서울에 남은 언론인들의 수난이 시작되었다. 수도를 점령한 공산군은 어리둥절 겁에 질린 시민들을 상대로 「반동분자」를 찾아내는 일대 수색작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언론인들의 피해상황은 다양했다. 몸을 숨기지 못했거나 발각된 사람들은 납북의 비운을 맞았다. 서울 점령 직후에 납북된 언론인도 있었고, 공산당의 손에 살해당한 언론인, 또는 그들의 회유에 넘어가 北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으며 공산군이 北으로 물러나면서 끌고간 언론인도 있었다.
공산당은 엄중한 가택수색을 벌이면서 저명인사들의 「귀순」을 종용했다. 6·25 당시 공산군에게 납치되어 在北평화통일촉진협의회 총무로 일하다가 돌아온 趙澈(조철)은 그가 경험하고 목격한 사실을 엮은 저서 「죽음의 세월」(성봉각, 1963)에서 납북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1950년 7월 하순 공산군은 80여 명의 저명 인사들을 서울시청에 모이게 한 뒤 그날 밤으로 군 트럭에 실어 北으로 끌고 갔다. 이날 시청에 모인 사람들은 남북 협상파로 알려진 정계 지도급 인물인 安在鴻(안재홍), 嚴恒燮(엄항섭), 趙琓九(조완구), 金奎植(김규식), 尹琦燮(윤기섭), 宋虎聲(송호성), 元世勳(원세훈)을 포함한 국회의원 趙憲泳(조헌영), 白象圭(백상규), 丘德煥(구덕환), 崔丙柱(최병주), 崔錫洪(최석홍), 柳驥秀(유기수) 등을 비롯하여 南宮赫(남궁혁), 具滋玉(구자옥), 金時昌(김시창), 李升基(이승기) 등 관계, 학계, 종교계와 의사 등이었다. 노동당 중앙당 조직부에서 파견 나온 金天明(김명천)은 이들에게 『여러분을 모시고 평양의 건설된 모습을 보여 주려고 이렇게 모이도록 한 것이다』고 말하고, 『구경을 한 뒤에는 서울로 다시 모시고 온다』면서 안심을 시켰다. 갑자기 끌려나온 바람에 아무 준비도 없이 가족에게는 『잠깐 다녀온다』는 말밖에는 남기지 못한 채 이날 밤으로 스리쿼터와 트럭에 각각 실려 北으로 길을 떠났던 것이다.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개별적으로 납북된 사람도 많았다>
납북된 언론인 가운데는 方應謨(방응모), 安在鴻, 白寬洙(백관수), 李光洙(이광수), 金億(김억), 金晉燮(김진섭) 등의 신문과 방송계의 거물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피살당한 언론인도 1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52년에 공보처가 조사한 「피살자 명부」에 피살로 확인되는 언론인은 李鍾麟(이종린·한말 대한민보 기자)을 비롯하여 高永煥(고영환·동아일보 논설위원), 孫相輔(손상보·여론신문 사장), 韓五赫(한오혁·상공신보 편집국장, 동아일보 기자), 鄭秀日(정수일·前 조선일보 기자)과 신문사의 소속이 확실하지 않은 朴瑢夏(박용하·신문사장, 국민회 간부), 洪承信(홍승신·기자), 安龍雨(안용우·기자), 康弘一(강홍일·기자)과 KBS의 李重根(이중근) 등이 피살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당시의 자료에는 자택에서 납치된 것으로 나와 있는 辛日鎔(신일용·일제시대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鄭均轍(정균철·동아일보 영업국장)도 피살로 알려져 있으며, 서울신문 기자 韓奎浩(한규호)는 한국기자협회가 건립한 순직종군기자기념비에 순직기자로 되어 있으나, 당시 기록에서는 순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KBS 아나운서였던 趙準玉(조준옥)도 피살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군속 李升鉉(이승현·23)은 북한군이 서울에 진주한 6월28일 정동방송국 문앞에서 피살되었다. 그는 방송인이 아니었지만 방송국을 경비하던 임무를 수행 중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와 적십자사의 자료를 종합하여 납북된 언론인을 신문사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소속 납북 언론인은 편집국장 申泰翊(신태익·58)을 비롯하여 시인이며 초대 주필이었던 鄭芝鎔(정지용)과 만화가 崔永秀(최영수·40)가 있다. 申泰翊은 9월1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1번지 자택에서 납북되었다. 보성전문학교를 중퇴하고 1921년 조선일보 기자로 출발하여 동아일보(1924.9)로 옮겼다가 1933년 9월에 퇴사하여 조선일보 경제부장, 東京지국장을 거쳐 1939년 4월 다시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이듬해 8월 폐간 때까지 광고부장을 지냈다. 1949년 2월 경향신문 편집국장에 취임하여 재직 중에 납북되었다.
鄭芝鎔은 납북자 명단에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납북된 날짜와 장소는 알 수 없으나 납북된 것으로 인정된다. 시인으로 널리 알려진 그는 8·15 광복 후 이화여자전문 교수와 경향신문 주필을 지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순수시인이었으나, 광복 후 좌익 문학단체에 관계하다가 전향, 輔導聯盟(보도연맹)에 가입하였으며 납북되었다.
崔永秀는 다양한 재능을 지닌 사람으로 만화가였고, 유머소설가 겸 시나리오 작가였다. 그는 1933년 6월 동아일보에 입사해서 「신동아」에 근무하면서 만화를 그리고 漫文(만문)을 썼다. 신동아 1934년 5월호에 실린 「조선 신문만화의 과거 현재 급 장래」는 신문만화에 관해서 최초로 정리한 글이다. 광복 후에는 경향신문 문화부장을 거쳐 전쟁이 일어나던 때에는 출판국장으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그는 방송을 통하여 유머소설가로 활약하고 시나리오도 집필해서 「죄 없는 죄인」, 「여명」 등의 역작을 내놓았다. 피난을 가지 못했던 崔永秀는 자택인 종로구 혜화동(가회동 2통 4반이라는 기록도 있다) 5통 6반 자택에서 7월12일에 연행되었다. 납북 후 8월11일 밤 11시경 해주까지 끌려갔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집단 탈주를 감행했는데 실패하여 주모자로 몰린 박윤선(중앙청 과장), 하진문(변호사)과 함께 즉결 처형되었다(대한적십자사, 「이산가족백서」, 대한적십자사, 1976, p. 184, 「납북인사들」).
경향신문 소속으로 납북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金奉烈(김봉열·41) 기자. 7월15일 명동 1가 4통 3반에서 납북. 安奉烈(안봉열·46·도렴동 87번지)이라는 「신문사 부장」도 납북되었는데 같은 인물인지 알 수 없다.
崔德熙(최덕희·19) 인쇄공. 9월15일 서대문구 창천동 1통 4반에서 납북.
韓國信(한국신·39) 경리부원. 8월6일 회기동 68에서 납북.
洪淳稷(홍순직) 기자. 용산구 용산동 818.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일제시대부터 관계했던 언론인을 포함하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17명이 납북되었다. 편집국장 張仁甲(장인갑·43), 일제시대 사장을 지낸 白寬洙(백관수), 일장기 말소사건에 관련되었던 운동부(체육부) 기자 李吉用(이길용), 사진부장 白雲善(백운선) 등 기자 또는 사원들이 납북되었다.
납북 당시 편집국장이었던 張仁甲은 1933년 6월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정치부, 사회부, 판매부에 근무하다가 1938년 9월에 퇴사하였는데, 광복 후에는 1948년 9월20일 文鳳濟(문봉제)가 창간한 국민신문의 편집국장을 맡았다가 한 달쯤 뒤 10월30일에 同紙가 폐간하자 동아일보로 옮겼다. 1949년 12월 동아일보 편집국장에 취임했는데 북한군의 서울 점령이 임박했던 6월27일 오후 남은 기자들을 지휘하여 손으로 찍은 마지막 호외를 제작하여 300 장 정도를 발행하고 무교동의 설렁탕집 실비옥에서 이별의 술잔을 나눈 뒤 헤어졌다. 피난을 가지 못했던 그는 7월12일 종로구 재동 460-4 자택에서 납북되었다.
白寬洙(백관수·62)는 7월5일 원남동 자택에서 납북되었다. 전라북도 高敞(고창) 출생으로 소년시절부터 金性洙(김성수), 宋鎭禹(송진우)와 친분이 있었는데, 1924년 혁신된 조선일보에 입사하여 상무이사 겸 영업국장, 편집인을 역임했다. 1927년에는 弘文社(홍문사)를 창설하여 월간지 「東方評論」의 편집 겸 발행인이 되어 3년 동안 발행했다.
1937년 6월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여, 그 전 해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무기정간 당했던 동아일보의 복간에 힘썼다. 광복 후 1949년 7월 동아일보 취체역이 되었고, 政界에 투신하여 한국민주당 총무, 민주의원 의원, 입법의원 의원을 거쳐 1948년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北으로 끌려가 1952년에는 평남 대동군 임시 수용소에서 감금되었다가 1957년 용강 양로원으로 수용 감금되었다.
李吉用(이길용·52)은 1936년 8월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 때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말소했다가 일경에 구속되었다가 신문사를 떠났던 체육 전문기자였다. 1916년 배재학당 졸업 후 일본 同志社(동지사) 대학에서 수학했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 기밀문서를 전달하다가 일경에 검거되어 3년 징역 후 1922년 출옥하였다. 동아일보 대전지국을 거쳐 본사 기자가 되어 사회부에 근무하면서 체육 취재기자의 선구자가 되었다.
총독부의 강요로 동아일보를 떠났다가 1945년 12월 동아일보에 복직하여 사업부장을 지냈다. 서울시 고문, 한국민주당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했는데,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무렵에는 신문사를 떠나 「대한체육사」를 집필하던 중이었다. 7월15일 성북구 성북동 56(3통7반) 자택에서 납북되었다. 한국체육기자연맹은 1989년에 「이길용 체육기자상」을 제정하여 매년 그 해 최고의 활동을 해 온 체육기자에게 시상해 오고 있다.
취체역 총무국장 金東燮(김동섭·42)은 일제시대에 경리부장을 지냈고, 1945년 12월에는 총무국장이 되었는데, 8월15일 청파동 1가 27에서 납북되었다.
사진부장 白雲善(백운선·40)은 7월10일 마포구 공덕동 4통 175의 210(또는 옥천동 93)의 자택에서 납북되었다. 1936년 5월에 입사하여 1940년 8월 동아일보가 폐간될 때까지 근무하였다. 1936년 「일장기 말소사건」에 관련되어 구속된 일도 있었고 1940년 8월 폐간 때까지 근무하였다. 광복 후에 다시 입사하여 납북 당시에는 사진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鄭均轍(정균철·43)은 1933년 6월에 입사하여 정치부, 사회부, 판매부에 근무하다 1938년 9월에 퇴사했고, 광복 후에 다시 입사하여 6·25 때에는 영업국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동아일보 社史」에는 鄭均轍을 피살로 기록하고 있지만, 공보처와 정부의 조사에는 6월29일 종로구 연건동 298의 3의 자택에서 납북으로 되어 있다. 1956년에 가족들이 등록한 납북자 명부에도 들어 있는 것을 보면 피살인지 납북인지 확실하지 않다.
李相弼(이상필·46)은 동아일보 판매부장으로 8월15일 성북구 성북동 236번지 자택에서 납북되었다.
申昌浩(신창호·35)는 정치부 기자, 정치부 차장을 지낸 후 퇴직하여 6·25 당시에는 고려축전지제조주식회사 사장이었는데 7월31일 종로 3가 파출소에서 납북되었다. 자택은 용산구 원효로 3가 7통 8반(원효로 3가 251)였다.
金準燮(김준섭·38)은 광고부와 조사부에 근무하다가 납북되었다.
동아일보는 서울 수복 직후인 10월3일 서울에서 속간 첫 호를 내면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원들의 가족 되시는 분은 즉시 본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는 社告를 게재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장인갑(편집국장), 정균철(영업국장), 이동욱(조사부장), 백운선(사진부장), 김성열, 서정국, 조용근, 변영권, 김준섭(이상 편집국 기자), 이성득(정판부장), 상복규(보급부 차장), 장성규(판매부 차장), 최화익, 이상필, 김인호, 이대종, 오득한, 정활모, 정봉진, 주재정(이상 사원)
위의 사원들 가운데 납북이 확실한 사람은 편집국장 장인갑을 비롯하여 정균철(피살), 백운선, 김준섭, 이성득, 이상필 등이었고 이동욱과 변영권은 北으로 끌려가던 도중에 탈출하였다.
납북 길에 탈출한 李東旭
주요내용
200여 명의 납북 언론인
납북 길에 탈출한 李東旭
필자의 말-돌아오지 못한 언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납북언론인 명단
동아일보와 관련된 납북 인물로 미군정청 대법원장을 지낸 金用茂(김용무·45), 고대총장 玄相允(현상윤·58), 역사학자 鄭寅普(정인보)도 있었다. 金用茂는 일본 중앙대학 법과를 졸업했고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하여 변호사를 하였는데, 1930년 10월부터 1940년 폐간까지 10년 간 동아일보의 취체역이었다. 보성전문학교장과 광복 후 미군정 대법원장, 제2대 민의원(민주국민당)을 역임했다. 7월21일(7.27) 인사동 225번지 자택에서 납북되었고, 1951년부터 1956년까지 평양 임시교화소에 감금되었다가 1956년 11월 在北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으로 동원되었으나 1957년 10월에는 병으로 수용소 요양원에 있었다 한다.
玄相允은 1925년 10월 동아일보 감사역에 피선되어 1940년 8월 日帝에 폐간당할 때까지 재직했다. 6·25 전쟁 때에는 고려대 총장으로 재직중 7월23일 가회동 자택에서 납북되었다.
鄭寅普(정인보·58)는 7월25일(또는 31일) 종로구 낙원동에서 납북되었다. 그는 1924년 5월부터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지냈는데 1923년부터 연희전문·이화여자전문·세브란스의학전문·중앙불교전문학교 등에서 국학·동양학을 강의했던 역사학자였다. 광복 후에 심계원장과 국학대학장을 지냈는데 자택은 중구 남산동 2통 2반이었다. 납북된 후 1950년 11월 북한군이 도주할 때에 묘향산 근처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鄭寅普는 중태로 걸을 수가 없어 후퇴하던 인민군이 업고 떠났는데 도중에 살해되어 시체가 산속에 유기되었다는 설도 있다(「죽음의 세월」, p. 52 이하 참고).
학살당한 高永煥(고영환·55)은 6·25 당시에는 동아일보 소속이 아니었지만 경력으로 보아 동아일보로 분류되어야 할 사람이다. 전남 담양 출신으로 동아일보 사장을 지낸 高在旭(고재욱)과는 한집안이었고, 동아일보 창립자인 金性洙와는 외척간이었다. 1925년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후 보성전문에서 교편을 잡다가 1933년 4월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정리부와 정치부 기자로 근무했다. 1945년 동아일보가 복간된 뒤 논설위원으로 근무했고, 잠시 대한독립신문 주간을 맡았다가 다시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9월21일 종로구 삼청동 자택에서 부인 許永淳(허영순)과 함께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제시대의 여기자 朴承浩(박승호·47)는 1940년 8월 폐간 때까지 학예부 기자였다. 6·25 당시에는 창덕여중 교장이었다. 자택은 종로구 사직동 32-17이었고 7월3일 창덕여중 교내에서 납북되었다.
李東旭(이동욱·34)도 7월29일에 종로구 누하동 4통 4반 자택에서 납북되어 한 때는 「행방불명」이었다. 그는 함경북도 개천까지 끌려갔다가 국군에게 구출되어 돌아왔다. 그 후 동아일보의 주필과 사장, 회장을 역임했다.
동아일보 취재 제1부장 邊永權(변영권·30)도 납치되었다가 탈출했다. 邊永權은 공산군이 서울에 침입하기 하루 전날인 6월27일 밤 아직 피난하지 않은 동료사원들과 호외를 만들어 광화문과 안국동 거리에 뿌렸다. 그 가운데는 편집국장 장인갑과 이동욱도 있었다. 변영권은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될 무렵 강제로 북쪽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함께 끌려가던 200~300명 가운데 상당수는 도중에서 총살당하거나 폭격에 희생되었다. 변영권은 함경도 영흥에서 홍원으로 가는 고갯길에 이르렀을 때 국군이 동해안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산 속에 숨어 있던 반공청년들이 인민군과 총격전을 벌이는 틈을 타서 도망쳐 살아났고 홍원지구에서 걸어서 서울로 되돌아왔다.
서울신문
「서울신문 40년사」는 확인된 납북자를 7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피살로 알려진 한규호 기자를 비롯하여 출판국장 김진섭, 편집부국장 박종수, 사회부장 이종석, 문화부장 여상현, 상임감사 姜柄順(강병순) 등이 있다. 박종화 사장의 비서였던 李昇魯(이승로)는 총에 맞아 숨졌다.
金晋燮(김진섭·44)은 8월5일 종로구 청운동 57의 10(3통5반)에서 납북되었다. 그는 방송인이기도 하고 연극운동에도 참여했던 사람으로 서울대학 교수이기도 했던 수필가였다. 일본 법정대학 출신으로 1941년 무렵부터 경성방송국에 근무하였고, 1945년 10월2일 방송국의 기구를 개편할 때에 편성과장이 되었다. 광복 후에는 서울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1949년 6월부터 서울신문 출판국장으로 서울신문 발행 월간지 「신천지」를 편집했다.
편집부국장 朴鍾秀(박종수)는 1945년 11월1일 발행된 「중앙신문」의 창간 동인이었는데 서울신문으로 옮겨 6·25 전쟁 중에는 편집부국장이었다.
韓奎浩(한규호·36)는 1945년 11월23일 서울신문 사회부 기자로 출발하였다. 국방부 출입기자로 6·25 이전 국군의 공산 게릴라 소탕 작전에 여러 차례 종군하였고 6·25 직후에는 전황을 알리는 기사를 썼다. 그러나 피난을 가지 못한 채 9월10일(내무부 조사에는 7월25일) 종로구 누하동 7통 2반 39의 3에서 정치보위부원에게 납북되었다. 그는 북한군의 손에 처형당했다는 설도 있어서 1977년 4월27일 한국기자협회가 경기도 문산에 한국전쟁 순직종군기자 추념비를 건립했을 때에 17명의 외국 종군기자 명단과 함께 한국 종군기자로서 유일하게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을 새겨 놓았다.
사장 비서 李昇魯는 6월28일 새벽녘에 인민군이 미아리 고개를 넘어온다는 급보를 받았으나 한강 인도교는 이미 폭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박종화 사장과 지프를 타고 급히 광나루로 향하다가 현재 신세계백화점 근처인 해군 헌병대 앞을 지나다가 총에 맞아 사망했다.
李貞淳(이정순)은 서울신문 감사역이었다. 1932년 연희전문 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조선중앙일보 사회부 기자로 출발했는데, 1936년 조선중앙이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 그려진 일장기를 말소한 사건으로 정간 당하자 매일신보로 옮겨 1940년 10월 사회부 차장, 동년 11월 도쿄 특파원, 오사카 지사장을 지낸 뒤 다시 본사 사회부 차장이 되었다. 1945년 10월 鄭寅翼(정인익)이 창간한 자유신문의 편집국장을 맡았다가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공보처 초대 공보국장이 되었다. 1949년 4월 서울신문 감사, 7월부터는 국무총리 이범석의 비서로 재직 중에 납북되었다.
시인이었던 呂尙鉉(여상현·38)은 일제시대 「인문평론」을 편집하다가 매일신보에 근무했다. 1949년 2월 서울신문 사회부장 겸 문화부장이 되었다. 시집 「칠면조」는 베스트셀러에 들기도 했는데, 8월 10(혹은 12)일 성동구 흥인동 3통 1반(또는 청파동 2가)에서 납북되었다.
李種奭(이종석·36)은 연희전문 출신으로 매일신보 기자로 출발했고, 경향신문 창간에 참여하여 사회부 차장으로 있다가 서울신문으로 돌아와 사회부장이었다. 7월12일 마포구 아현동 1가 4통 6반에서 납북되었다.
서울신문 2대 사장을 지낸 河敬德(하경덕)은 피난 가지 못하고 서울에 숨어 있다가 붙들려 인민군이 후퇴할 무렵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서울이 수복되는 혼란 와중에 형무소에서 가까스로 탈옥하여 서울 근교의 산 속을 3일 간 굶으며 헤매다 간신히 돌아온 뒤 병을 얻었는데 미군당국의 협조로 일본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그곳에서 사망했다. 河敬德은 저명한 사회학자였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사장 方應謨(방응모·68)가 7월6일(납북자 명단에는 7월9일 또는 21일) 성동구 신당동 2통 2반 366의 20 자택에서 성동 내무서원에게 피납되었다. 方應謨는 1933년 7월10일 자본금 30만원을 불입하고 조선일보 사장에 취임하여 경영난이었던 신문의 사세를 확장하고 경영을 안정된 기반에 올려놓았다. 1940년 8월 일제의 강압으로 조선일보가 폐간되었으나 광복 후 1945년 11월23일에 복간하였다. 납북 후 生死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조선일보는 1953년 그를 명예사장에 추대하였다.
金起林(김기림·42)은 납북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였다. 일본대학 문학예술과와 동북제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30년 4월 조선일보 공채 기자로 입사하여 사회부를 거쳐 1940년 학예부장을 맡았다. 기자생활과 시인의 활동을 병행하면서 主知主義(주지주의) 문학론을 도입하여 문단에 새로운 詩와 詩論을 가지고 모더니즘 운동의 기치를 올렸다. 7월21일 을지로 4가 도로상에서 납북되었다.
일제시대 조선일보 주필을 지냈던 辛日鎔(신일용·59)은 사회주의 논객으로 투옥 또는 망명생활도 했던 인물이다. 광복 후 고향인 전북 부안에서 제헌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서울에서 학살당했다.
鄭秀日(정수일·53 또는 57)은 1927년 12월에 발간된 「別乾坤(별건곤)」에 「신문기자가 본 조선경제」를 썼는데 「조선일보 정수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에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지는 알 수 없다. 1928년 6월에는 「經濟」라는 잡지를 창간하였으나 창간호만 발행한 후 계속하지는 못했다. 1930년 1월에는 월간 「中央」에 「대재벌의 진출과 조선경제의 전망」이라는 논문을 실었으나 상당부분이 삭제되었다. 1950년 1월에는 「大衆日報」의 주간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인천시 신생동 39번지에 살고 있었는데, 본적인 화성군 송산면 지화리 근처인 송산면 사강리에서 8월25일(또는 9월)에 살해되었다.
朴晩儁(박만준·30)은 공보처의 자료에 「신문기자 조선일보 출입기자, 중앙대 졸 조선신문학원 졸」로 기록되어 있고, 정부가 조사한 자료에는 「조선일보 종군기자」로 되어 있다. 8월14일 자택인 성북구 돈암동 9통 7반 224의 9번지에서 납북되었다.
조선일보의 취체역 徐光卨(서광설), 李雲(이운), 韓在謙(한재겸), 감사역 白麟濟(백인제), 安炳仁(안병인)과 기자 5~6명이 행방불명되었다.
한성일보
漢城日報(한성일보)는 사장 安在鴻을 비롯하여 주필 김기천, 편집국장 김찬승, 초대 편집국장이었던 양재하 등이 납북되어 피해가 컸기 때문에 6·25 전쟁 이후에는 다시 복간되지 못하였다.
安在鴻(안재홍·61·호 民世)은 일제시대에는 조선일보의 주필과 사장을 지낸 언론인으로 광복 후에는 정치인이었으나 납북 당시에도 한성일보 발행인이면서 국회의원으로 新生會(신생회) 회장이었다. 그는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정경학부를 1914년에 졸업했는데 1924년 3월 31일 최남선이 時代日報(시대일보)를 창간했을 때 논설반과 정치부장을 맡았다.
1924년 9월 조선일보로 옮겨 주필 겸 이사가 되었고 1925년 4월에 열린 全조선기자대회에서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1926년 9월부터는 조선일보 주필이면서 발행인을 겸했다.
그는 언론인으로서 필화 또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여러 차례 구속 투옥 당했다. 1929년 1월에는 조선일보 부사장이 되었다가, 1931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는 사장이었다. 광복 후에는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1946년 2월26일 한성일보를 창간하여 사장이 되었다.
美군정의 과도입법의원의 관선위원, 美군정의 행정부 한국인 최고책임자인 民政長官(민정장관)을 지냈다.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平澤·무소속)되었는데, 성북구 돈암동 산11의 152(또는 445) 자택에서 서울이 수복되기 직전인 9월25일에 납북되었다.
북한으로 끌려가서는 在北평화통일촉진협의회(1956년 7월)의 최고위원 겸 당무위원 및 집행위원이 되었는데 1965년 3월1일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5권으로 된 「安在鴻全集」이 있다.
梁在廈(양재하·43)는 1930년 조선일보 기자로 출발하여 1933년 10월 동아일보로 옮긴 뒤 1940년 8월 폐간 때까지 경제부와 사회부에서 근무했다. 광복 후 10월5일 新朝鮮報(신조선보)를 창간하여 주간을 맡았다가 1946년 2월26일 한성일보의 편집 겸 발행인으로 편집국장에 취임했다. 1950년 5월 경북 문경에서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9월18일 납북되었다. 자택은 용산구 청파동 1가 2통 4반이었다.
金基天(김기천·51)은 공보처의 조사에 의하면 「한성일보 주필」로 9월25일 서대문 2가(또는 남대문 2가) 중앙토건에서 납북되어 행방불명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자택은 성북구 돈암동 13통 7반이었다. 김기천의 언론계 경력은 알려진 것이 없다.
한성일보 편집국장 金燦承(김찬승·40)은 7월27일(또는 7월5일) 동대문구 신설동 363의 6 자택에서 납북되었다. 그는 일제시대에는 동아일보의 원산·청진 특파기자를 지냈는데, 광복 후 서울에서 조선일보 사회부장, 경향신문 편집국 차장을 역임하다가 한성일보 편집국장이 되었다. 사원 愼一男(신일남·32)은 8월25일 중구 저동 1가 1통 4반에서 납북되었다.
연합신문
편집부국장 安燦洙(안찬수·35)는 7월 5일 종로구 청진동 7가에서 납북되었다. 보성전문을 졸업하고 1938년 경성일보 기자로 출발하였다가 광복 후 1945년 11월10일 창간된 大公日報(대공일보:사장 洪鍾祐)의 정리부장, 1946년 5월1일 창간된 獨立新報(독립신보)의 편집위원을 거쳐 조선일보 편집부장, 평화일보의 편집부장과 편집국차장을 지냈다. 그리고 1949년 1월22일에 창간된 연합신문(사장 양우정) 편집부국장이 되었다. 6·25 직전인 6월1일자로 연합신문 駐日 특파원(이사)에 임명되었다. 연합신문은 6월2일 「社告」를 통해 안찬수 특파원 등 일행이 곧 일본으로 떠날 것임을 알렸다. 그러나 불행히도 며칠 후에 일어난 6·25 전쟁으로 일본 특파원으로 현지에 가지도 못한 채 납북되고 말았다. 자택은 종로구 팔판동 2통 6반 81의 2번지였다.
金輔民(김보민·35)은 연합신문에 근무하였다는데, 납북자 명단에는 「국방부 신문」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7월14일 서울 안남동 전신통신에서 납북되었으며 자택은 종로구 가회동 2통 12반이다.
자유신문
부사장 鄭寅翼(정인익·48·호 念坡)은 1924년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입사했다가 1930년 2월 매일신보로 옮겨 사회부장, 사업부장(1938.5), 도쿄지국장을 거쳐 1940년 8월 귀국하여 편집국장이 되었고, 1943년 4월에는 학예부장을 겸했다. 광복 후 1945년 10월5일 自由新聞(자유신문)을 창간하여 사장에 취임했다가 후에 申翼熙(신익희)를 사장에 추대하고 자신은 부사장으로 재직중이었다. 9월13일 종로구 돈의동 2통 12반(또는 가회동 47) 자택에서 납북되었다.
馬泰榮(마태영·42)은 일제시대 조선중앙일보 기자로 출발하여 매일신보 기자로도 활동했다. 광복 후 자유신문(1945년 10월5일) 창간 同人이 되어 편집부장, 편집국 차장을 거쳐 전쟁 당시에는 편집국장이었다. 7월11일 종로구 연건동 46번지 자택에서 납북되었다.
韓相稷(한상직·38)은 극작가였는데, 중앙신문 사회부장(1947.7)을 거쳐 자유신문 문화부장을 잠시 맡았다가 1948년 11월 공보처 공보국 보도과장이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6월23일 공보국장 이정순과 함께 물러나고 국제보도社 편집국장에 재직중이었다. 7월15일(또는 8월6일) 종로구 신문로 2가 1의 54 자택에서 납북되었다.
崔泳駿(최영준·33)은 9월14일 성북구 돈암동 392의 1에서 납북되었다. 자유신문사 소속이었으나 기자였는지, 사원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태양신문
편집국장 南國熙(남국희·43)는 8월3일(또는 8월7일) 을지로 4가에서 납북되었다(자택은 중구 도동 2가 4통 41반 105의 2). 그는 1945년 10월5일 창간된 呂運亨(여운형)계의 일간지 新朝鮮報에 참여했다가 한성일보의 편집국장을 거쳐 태양신문 편집국장 재직중에 납북되었다. 납북 후 1956년까지 북한 국립출판사 교정원으로 근무하다가 1959년 초 함북 무산탄광으로 이동하였다.
李榮根(이영근·37)은 태양신문사 고문이었는데 7월20일 내무서에 연행되어 납북되었다. 자택은 중구 충무로 4가 4통 24반. 그는 대구에서 발행되던 民聲日報(민성일보)의 발행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劉(兪)南鎭(유남진·39) 전무. 7월 6일 성동구 신당동 6통 5반에서 납북.
金亨徹(김형철·34) 사원. 7월3일 용산구 한남동 6통 5반에서 납북.
崔德均(최덕균·33) 사원. 7월14일 용산구 효창동 122에서 납북.
기타 신문사
現代日報 사장 徐相天(서상천·48)은 대한역도근로단 중앙총본부 총재였고, 독립청년단장이었다. 1946년 11월에는 「경제신문」을 창간하여 사장에 취임했는데 이듬해 1월에는 정간중인 「현대일보」를 인수하여 2개의 신문을 소유하였다. 1948년 4월 제헌국회의원으로 서울 종로구에서 입후보하였으나 낙선하였다. 10월8일에는 필화사건과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된 일도 있었다. 7월5일 마포에 있는 형의 집에서 납북되었다. 주소는 종로구 화동 2통 4반.
民主日報 사장 安柄仁(안병인·40)은 8월15일 삼각산 승가사에서 납북되었다. 자택은 종로구 궁정동 3통 15반 1번지. 민주일보는 1946년 6월에 창간되었는데 안병인은 창간 당시에는 이사였으나 12월에는 상무, 전무를 맡았다가 정부가 수립되던 무렵인 1948년 8월에는 사장이 되었다. 주필 柳根昌(유근창·50)은 1948년 3월1일 朝鮮生活品營團(조선생활품영단)의 기관지로 창간된 「민생보」의 주필이었다가 민주일보로 옮겼던 것 같다. 8월14일 생활품영단에서 납북되었다. 자택은 종로구 내수동 1통 8반 2406번지였다.
婦人新聞 사장 黃基成(황기성·49)은 1946년 7월3일에 결성된 한국여론협회 부인위원장을 맡았던 여성운동가로 1947년 4월20일에 창간된 「여성신문」의 사장이었다. 여성신문은 그 전 해 5월12일에 창간된 「부녀신문」의 제호를 바꾼 것인데 오래 발행되지는 않았다. 8월8일(또는 8월29일) 남대문 노상에서 납북되었고, 자택은 서울 신교동 6-30이었다. 납북자 자료에는 황기성이 부인잡지사 부사장과 대한부인회 부회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자 黃泰興(황태흥·28)은 8월14일(13일) 서대문구 충정동 3가 23통 7반(또는 3가 75, 또는 78)에서, 기자 金聖萬(김성만·24)은 9월3일 영등포구 흑석동 1통 1반(흑석동 6-2)에서 각각 납북되었다.
平和新聞의 朴商鶴(박상학·43)은 東京정치영어학교를 졸업했는데 1947년 12월 현대일보 정경부 차장이 되었고 이듬해 1월에는 정치부 차장을 거쳐 11월에는 평화신문 조사부장(기자)이 되었다. 그는 7월15일(또는 6월30일) 서대문구 정동 6통 4반 21번지(또는 서소문동 53번지)에서 납북되었다.
현대일보 기자 曺秉權(조병권·36)은 8월25일 중구 을지로 3가 5통 9반에서, 비서 李暎賢(이영현·21)은 7월29일 종로구 낙원동 4통 4반에서 납북되었다.
輿論新聞은 1948년 10월16일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진관내리에서 창간된 주간신문이었다. 이듬해 4월에 혁신탐정사의 기관지로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번지에서 속간하면서 양근환이 사장, 주필은 손상보로 출발하였다.
梁槿煥(양근환·57)은 7월5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2통 1반 자택에서 납북되었다. 그는 東京유학 중이었던 1921년 1월 16일 친일지 時事新聞(시사신문) 사장 閔元植(민원식)을 암살했던 인물이다. 13년 간 옥살이를 한 후 1933년 2월11일 가출옥했다. 1948년 10월4일에는 혁신탐정사의 기관지로 주간 革新報(혁신보)를 창간하여 사장에 취임했다. 1949년 3월29일 혁신보는 자진폐간하고 여론신문을 인수 발행하였다.
孫相輔(손상보·43)는 여론신문 주필로 9월22(또는 7월16일) 서대문형무소에서 피살되었다. 자택은 종로구 창성동 2통 6반 109의 2번지.
商工新報 1950년 12월 공보처가 조사한 자료에는 商工新報(상공신보) 편집국장 韓五赫(한오혁·39)이 9월25일 서대문구 대현동 14통 20반 자택에서 피살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였던 1947년 8월28일 조선신문기자협회가 파견한 호남지방시찰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적이 있었고, 1950년 5월에는 상공신보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서대문 갑구에서 제 2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했다.
공보처 조사에는 그가 한국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경력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발행되는 한국일보가 아니라 1948년 12월7일 사장 韓根祖(한근조), 부사장 文鳳濟(문봉제), 편집국장 金聖柱(김성주)의 진용으로 창간되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신문이다. 한오혁이 언제 이 신문의 국장이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西北新聞은 1948년 1월23일에 창간된 주간신문으로 서북청년회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 6·25 당시의 사장은 李水寧(이수녕·37)이었고, 국민당 서청간부로 7월15일 중구 남창동 10통 4반에서 납북되었다. 그밖에도 서북신문 소속의 다음 사람들이 납북되었다.
崔麟鳳(최인봉·40) 판매부. 종로구 낙원동 260의 170.
韓命圭(한명규·37) 사원. 7월22일. 도동 1가 69에서 납북. 자택은 중구 회현동 서부 3통 4반.
金秉琦(김병기·25) 기자. 7월28일. CIC 영등포지부. 영등포구 영등포동 4통 3반.
高德成(고덕성·20) 학생기자. 9월3일. 영등포구 흑석동 4통(또는 6통) 1반.
林成植(임성식·18) 학생기자. 9월3일. 흑석동(또는 영등포구 영등포 5가 6통 3반)
水産經濟新聞 기자 具英勉(구영면·25)은 국방부 출입이었는데, 8월14일 온양에 갔다오는 길에 납북되었다. 자택은 종로구 공평동 3통 15반 133.
朴瑢夏(박용하·61)는 공보처 자료에는 직업이 「신문사장, 국민회 간부」로, 「피살자 명부」에는 신문기자로 되어 있는데 나이로 보아 현역 기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 종로구 삼청동에서 9월26일 피살되었다.
洪承信(홍승신·33)도 직업이 신문기자로만 되어 있는데, 주소는 중구 충무로 3가였고 고양군에서 9월22일 피살되었다.
安龍雨(안용우·35)는 경기도 부천군 大阜面(대부면) 東里(동리) 440 자택에서 8월22일 피살되었다.
기자 康弘一(강홍일·35)은 9월25일 평택군 서탄면 수월암리 자택에서 4명이 함께 살해되었는데 康漢呈(강한정·68·농업), 康達一(강달일·32·농업), 康濟一(강제일·22·경관)이 일가족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통신사
통신사에 종사했던 인물 가운데는 朝鮮通信→高麗通信→韓國通信으로 이어지는 통신사의 최고 경영진 세 사람이 모두 납북되었고 북한에서도 같은 운명에 처했다. 납북자 명단에 한국통신 사장 金承植(김승식) 또는 金承烈(김승열)로 기재되어 있는 인물은 金丞植(김승식·48)의 誤記(오기)일 것이다.
金丞植은 미국에서 공부한 후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던 사람으로 1945년 9월4일 조선통신을 창간하여 10월27일부터는 미국 UP통신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광복 후 한국 최초의 대통신사를 설립하였다.
1950년 5월에는 전남 강진에서 제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했고, 7월 25일 삼청동 35번지(또는 종로구 가회동 1통 5반 11번지)에서 납북되었다. 北으로 끌려간 후 1956년 7월까지 평양교화소 분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8월경 평북 수풍발전소 근처로 강제 이주하여 노동자로 이용되었다.
金容采(김용채·53)도 조선통신 사장이었다. 그는 광복 이전 조선일보 東京지국장(1930.2~1933.6), 일본 신문연합통신사(1933~1935), 동아일보 광고부장(1935), 조선일보 오사카지국장(1936.11), 도쿄지사장(1938.10)을 지냈다.
1945년 9월 김승식이 조선통신을 창간할 때에 부사장 겸 발행인이었는데 조선통신이 폐간하자 金容采는 1948년 11월 조선통신의 진용을 그대로 인수하여 고려통신을 창간했다.
1949년 10월1일에는 고려통신의 제호를 한국통신으로 고쳐 발행하던 중 7월30일 종로구 장사동 4통 2반 자택에서 납북되었다.
북한에서는 1956년 7월 在北평화통일촉진협의회 참석하였으나, 8월경 함북 각 협동농장 및 수력발전소 노동자로 이동되었다.
李重熙(이중희·48)는 1946년 10월 김승식의 조선통신 사무총국장에 취임했다가 부사장이 되었던 인물이다. 1949년 10월1일 김용채가 조선통신을 인수하여 고려통신을 창간했을 때에 이중희는 대표 취체역을 맡았다. 1950년 5월 경남 마산에서 제2대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에는 「한국통신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통용되었다.
그러나 마산에서는 24명의 후보가 난립하자 자진 사퇴하였다. 그는 이해 8월10일 종로구 삼청 서부동 1통 3반 자택에서 납북되어 1956년 7월 在北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으로 참석하였으나 1959년 초 함경북도 무산농장으로 이주하였다.
합동통신 사회부장 鄭光鉉(정광현·39)은 일제시대 매일신보 기자였다가 광복 후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사회부 차장을 지냈고, 새한민보 취재부장을 거쳐 1947년 9월부터 합동통신 사회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으로 「머리의 기자, 발의 기자를 겸하고 금상첨화로 名文速筆(명문속필)이어서 앞날의 대성이 크게 기대되는」 것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인데 8월14일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263에서 납북되었다.
(납북자 명단에 鄭庚鉉(정경현·33)이라는 통신사 사원이 있었는데 정광현과 같은 날 같은 장소(8월14일, 돈암동 263의 1)에서 납북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정광현과 같은 인물일 것이다.)
元老 언론인
납북 당시 언론사에 소속되지는 않았지만 일제시대부터 언론계에 종사했거나 언론과 깊은 관련을 지녔던 원로 언론인도 많았다.
시인이면서 언론인이었던 金東煥(김동환·59)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 198(모래내 3구 15통 11반)에서 납북되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기자로 활동하던 김동환은 1929년 6월 월간잡지 「三千里」를 창간하여 1941년 11월까지 발행한 뒤 1942년 5월부터 「대동아」로 제호를 바꾸어 발행하였던 언론인이다.
광복 후 三千里를 복간하여 발행하던 중 납북되었다. 北으로 끌려가서는 1953년 3월경 평남일보 교정원 겸 잡부로 근무했고, 1956년 7월 在北 평화통일촉진협의회 중앙위원으로 동원되었으나 1958년 12월경 평북 집단수용소로 추방되었다.
金東進(김동진·48)은 일제시대 매일신보 전무를 지냈던 사람으로 9월10일 경기도 양주군 화도면 녹촌리 321에서 내무서원에게 납북되었다. 평양출생으로 어려서 러시아령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자라 러시아語에 능통했다.
1924년 1월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정치부와 사회부 기자로 활동하다가 1933년 5월 퇴사하여 조선일보 東京지국장을 지냈고, 1940년 9월에는 매일신보로 옮겨 총무국장, 상무를 거쳐 1943년 3월에는 전무 겸 발행인이 되어 광복될 때까지 재임하였다. 1949년 2월에는 반민특위에 체포된 적도 있었는데 되었다가 이듬해 5월 31일에 보석으로 출감하였는데 납북당한 것이다.
金炯元(김형원·51)은 공보처 차장을 지낸 언론인으로 7월7일 종로구 청운동 5통 3반 108의 7 자택에서 납북되었다. 그는 1919년 매일신보 기자로 언론계에 투신했는데 1920년 4월 동아일보 창간에 참여하여 사회부에 근무하다가 같은 해 8월부터 1923년 5월까지 사회부장을 지냈다. 23세의 사회부장이 되었으므로 동아일보에서 가장 젊은 부장이었다.
1923년 5월에는 도쿄특파원으로 근무하다가 1924년 5월에 조선일보로 옮겨 사회부장·지방부장을 지냈다. 1926년 中外日報(중외일보) 사회부장, 1930년 편집부장을 역임한 뒤 다시 조선일보로 돌아가 1934년 1월부터 1937년 11월까지 편집국장을 지냈다. 1938년 5월 매일신보 편집국장이 되었다가 1940년 1월 퇴사했다.
1945년 12월 조선일보 복간 때에 다시 편집국장이 되어 1946년 1월까지 재임한 뒤 서울신문 전무를 거쳐 1948년 공보처의 초대 차장을 지냈던 언론계의 중진이었다. 그는 서울에서 납북되어 1953년까지 강계 만포진 평양 대동군 수용소에 감금되었다가 1954년 초 북한의 출판사 잡부 및 교정원으로 있다가 1956년 함북 방면으로 이주되었다.
李光洙·李聖根·崔麟 등
方台榮(방태영)은 매일신보의 外事課長(또는 외교부장:지금의 외신부장)으로 1919년 7월부터는 편집인 겸 발행인이었다. 1921년 3월에는 신문사를 떠났으나 1926년 12월에 설립된 사단법인 경성방송국의 이사로 광복될 때까지 방송사업에 관여했다. 그 중간인 1929년 1월에는 조선인쇄주식회사 상무취체역에 취임했고,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7월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97에서 납북되었다.
柳子厚(유자후·55)는 저술가이며 한학자였지만 1946년 2월2일 발행된 「世界日報」(지금의 세계일보와는 관계가 없다)의 사장을 지낸 적이 있었다. 청운동 52의 1번지에서 납북되어 1953년 8월까지 북한 평양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1953년 9월 국립출판사 노동자 겸 교정원으로 근무했고, 1957년 함남 북청 방면의 과수농장 노동자로 이주되었다.
李光洙(이광수·59)는 소설가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1919년 8월21일 上海(상해)에서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사장을 맡았고, 귀국 후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편집국장, 부사장을 지냈던 언론인이었다. 종로구 효자동 175번지 자택에서 납북되었다(「죽음의 세월」 p.52 이하 참고).
李聖根(이성근·63)은 일제 말기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사장이었다. 그는 일제 경찰 고위직을 지냈는데 1941년 6월16일 매일신보 사장에 취임하여 광복될 때까지 4년 2개월 동안 재임했다. 창씨 개명한 이름은 金川 聖이었다. 광복 후 反民特委(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8월6일 성동구 신당동 236의 11(또는 성동구 황학동 3통 4반) 자택에서 납북되었다.
李鍾麟(이종린·68)은 한말 「大韓民報(대한민보)」의 기자였던 원로 언론인이다. 3·1운동 때에는 비밀리에 「조선독립신문」을 발간하다가 체포되어 1921년 5월까지 복역했다. 출옥 후에는 「천도교회월보」의 사장이 되었고, 언론단체 「無名會(무명회)」에서도 활동했다. 1948년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제2대 국회의원에 재선되어 외무국방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공보처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9월29일 성북구 성북동 1통 4반에서 성북경찰서로 끌려가 「피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이 수복되던 날인 9월28일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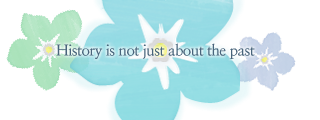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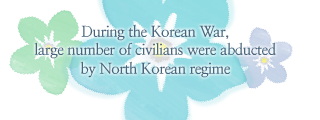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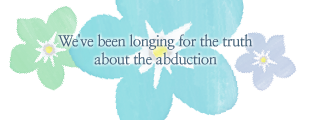









 FAX : (82)31-930-6099
FAX : (82)31-930-60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