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관리자
2011-05-12 12:23:00 | 조회: 1928
2011. 5.
한국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1950년 6월, 한반도에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유엔의 깃발아래 미국을 비롯한 세계 16개국이 ‘평화의 파괴자’에 맞서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한 정의로운 전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준 미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전쟁은 1953년 휴전이 되었지만 저희 전쟁납북 피해가족들에게 이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0년이 넘도록 한국전쟁 중 북한이 납북해 간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사조차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 남한 각계의 지도자들을 비롯한 필요한 인력들을 사전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선별하여 납북하거나 전쟁수행에 동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8만 명을 넘습니다. 이는 적대 행위에 참여하지 않은 비전투 민간인들을 위협하여 납치한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입니다.
당시 한국전쟁 휴전회담 유엔군 측 대표였던 미국은 남한민간인 납북문제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1951년 12월 시작된 휴전회담 포로문제 분과위원회에서 북한이 억류한 외국 민간인들의 경우 북한의 자발적인 석방조치와 유엔군 측의 관심으로 1953년 4월경에 귀환하였습니다.
그러나 납북된 남한민간인의 경우 북한은 없다고 했고 자진 월남한 북한주민 50만을 유엔군이 ‘납치’해갔다는 억지 주장을 거듭하면서 남한민간인 납북범죄를 은폐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휴전이 시급했던 유엔군 측은 남한민간인 납북문제 협상에서 ‘납치’라고 언급하지도 못했습니다.
북한의 완강한 납북사실 부인과 포로교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휴전협상 당시 상황 때문에 유엔군 측이 납북문제까지 제시할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휴전회담이 더욱 난항을 겪게 될 것을 경계한 유엔군 측은 납북자 문제를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에 포함시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displaced’라는 용어에서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abduction’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용어는 ‘자진월북자’만 있을 뿐 타의에 의한 ‘납북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억지 주장을 오히려 객관화 해주었습니다.
중립기구의 감독 하에 실향사민의 자유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유엔군 측의 주장마저도 끝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휴전협정이 조인되고 협정문 제59항에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두어 귀향을 원하는 민간인들의 송환을 적극 돕는다고 규정되어있지만 1954년 3월 실향사민을 송환하기로 한 날 북한은 ‘귀향을 원하는 남한민간인은 없다’며 단 한 명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납북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대재앙이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희는 한시도 납북된 가족을 잊고 산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늦게나마 2010년 한국 국회에서 한국전쟁 납북자 특별법을 입법하여 정부가 납북피해 진상규명 등 납북자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 것은 고무적인 발전입니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노력만으로 북한을 상대로 전쟁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 휴전회담 대표직을 수행했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미국 의회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전쟁 납북자 결의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1. 한국전쟁 휴전회담에서 잘못 사용된 ‘실향사민’이라는 용어를 ‘납북자’ 로 정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2. 한국전쟁 중 남한민간인 납북범죄를 시인하도록 북한을 압박
3. 북한에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소식전달, 유해송환 등을 촉구
긴 세월 동안, 사랑하는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 생사조차 알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호소를 들어 주시어, 휴전협상에서 희생양이 된 납북자들에게 이제라도 소중한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부여되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상하의원님들께서 이 ‘한국전쟁 납북자 결의안‘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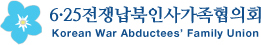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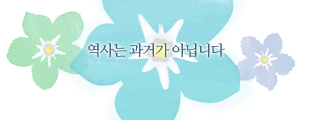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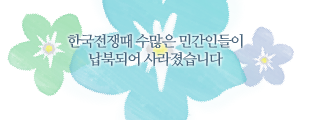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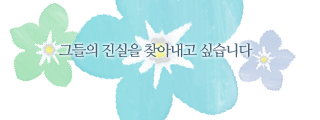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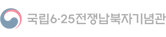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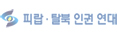



 TEL : 031-930-6025
TEL : 031-930-6025

